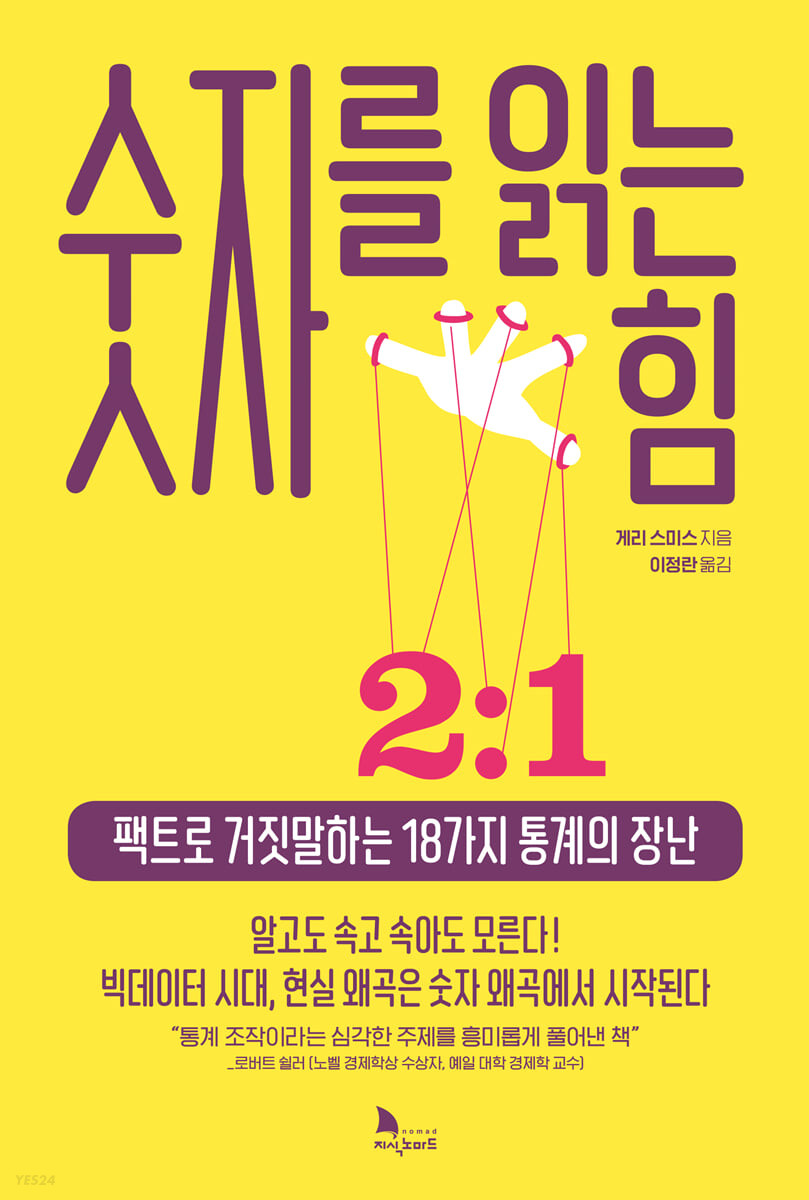서브메뉴
검색
숫자를 읽는 힘 : 팩트로 거짓말하는 18가지 통계의 장난
숫자를 읽는 힘 : 팩트로 거짓말하는 18가지 통계의 장난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87481904 03320 : \18,000
- 언어부호
- 본문언어 - kor, 원저작언어 - eng
- DDC
- 519.5-20
- 청구기호
- 519.5 S648s이
- 저자명
- Smith, Gary , 1945-
- 서명/저자
- 숫자를 읽는 힘 : 팩트로 거짓말하는 18가지 통계의 장난 / 게리 스미스 지음 ; 이정란 옮김
- 기타표제
- [기타표제]알고도 속고 속아도 모른다! 빅데이터 시대, 현실 왜곡은 숫자 왜곡에서 시작된다
- 기타표제
- [원표제]Standard deviations
- 발행사항
- 서울 : 지식노마드, 2021
- 형태사항
- 447 p. : 삽도, 챠트, 미확인, 미확인 ; 23 cm
- 주기사항
- 원저자명: Gary Smith
-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p.438-447
- 기타저자
- 이정란
- 기타저자
- 스미스, 게리
- 기타저자
- Gary Smith
- 가격
- \18,000
- Control Number
- joongbu:596748
- 책소개
-
숫자를 믿어야 할 때가 있고
의심해야 할 때가 있다
거짓 숫자가 불러온 재정 정책의 참패
2010년 하버드 대학의 두 경제학 교수는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90퍼센트를 넘으면 경제성장이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90퍼센트’ 초과 지점을 경기침체로 접어드는 티핑 포인트로 제시한 것이다. 하버드 대학 교수라는 권위와 구체적인 숫자 데이터가 결합하면서 이들 교수의 주장은 긴축재정에 관한 설득력 있는 근거로 받아 들여졌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13년 공화당의 예산안을 보면 자신들의 재정정책 정당성을 이들 교수의 이론에 두었고, 영국 보수당 지도자인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가 주창한 ‘긴축의 시대(Age of Austerity)’의 이론적 토대 역시 이 이론이었다.
두 경제학 교수의 주장에 근거한 재정긴축 정책의 결과는 어땠을까? 대표적으로 유럽의 평균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1년 10퍼센트에서 2012년 11퍼센트, 2013년에는 12퍼센트로 상승했다. 재정긴축을 옹호하며 자주 목소리를 높였던 국제통화기금(IMF)조차도 유럽의 재정긴축 정책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해로운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들 경제학자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모든 경제학자가 ‘정부부채 비율 90퍼센트’ 초과에 내포된 위험에 동의한다는 뉘앙스의 기사를 실었지만 많은 경제학자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당시 대다수 경제학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정부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일은 2007년 12월에 시작된 대침체로 경제가 불안한 현 상황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다.
두 교수의 주장이 담긴 연구논문을 검증해본 결과, 데이터 일부의 선택적 누락 및 의도적 선별, 비정상적인 평균 계산 등 객관적 연구라고는 볼 수 없는 통계적 오류와 데이터 조작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긴축재정 정책 지지자들은 자기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유명 교수의 연구결과를 맹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 생각해보라. 정부부채 비율이 90퍼센트라고 하면 심각한 수준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우선, 정부는 부채를 당장 상환해야 할 강력한 이유가 없다. 우리 자신만 해도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 연소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끌어온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가? 대출금을 즉시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핵심은, 소득으로 대출금을 매월 갚아나갈 수 있는지 여부이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다. 게다가 정부는 필요하면 화폐를 직접 발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훨씬 덜하다.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정부부채 비율이 왜 90퍼센트인가? 80퍼센트나 100퍼센트는 왜 안 되는가? 경제성장과 경기침체 사이에 90퍼센트라는 마법의 숫자가 있어야 할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다.
현실을 보면, 반대로 경기침체로 인해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기침체하에서는 정부 세수는 감소하고 실업급여 및 저소득층 대상 식료품 구매권, 기타 사회안전망에 대한 정부 지출은 증가한다. 세수는 줄고 지출은 느는 두 가지 상황은 정부차입 규모를 확대시킨다. 이렇게 해서 경기침체는 GDP 하락뿐만 아니라 정부부채 증가를 불러온다. 만약 경제성장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사이에 통계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는 주로(또는 전적으로) 경제가 정부부채 비율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지, 정부부채 비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은 아니다. 과도한 정부부채 비율이 경제성장 둔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 둔화가 정부부채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